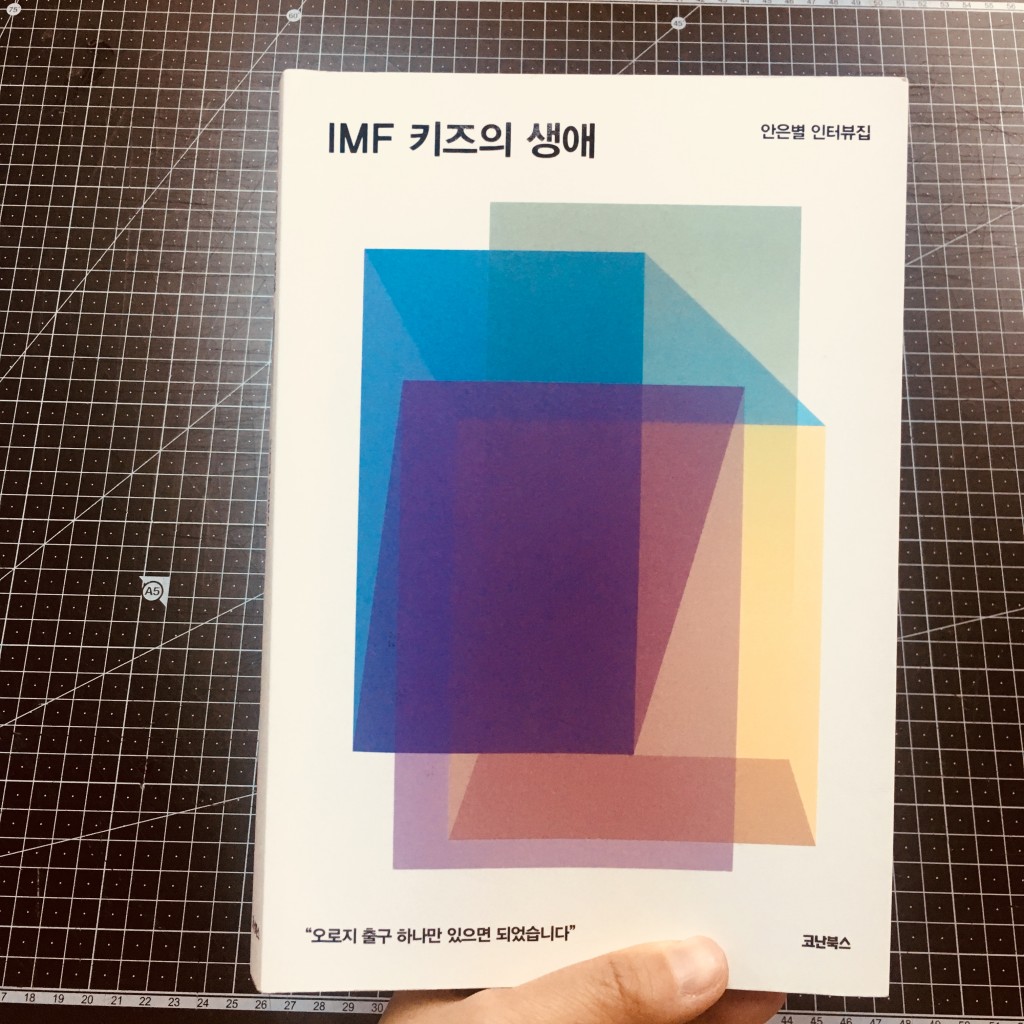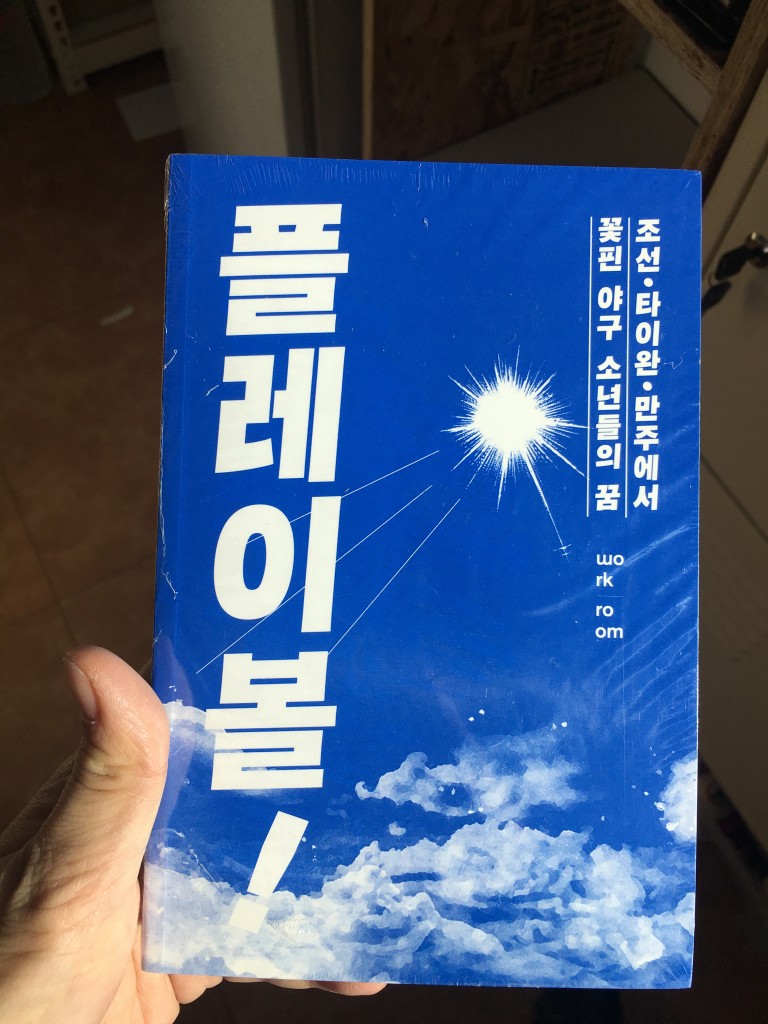게으른데다가 최근 각자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진 우리는 크리스마스에도 아무 계획이 없었다. 24일 밤에 남편과 ‘강철비’를 보고 들어왔고, 나는 읽다 만 이 책을 새벽 4시까지 다 읽고 잠이 들었다. 이것이 올해의 우리의 크리스마스였다.
나는 이 책의 서문만 읽었을 때 화가 날 정도로 서운했다. IMF 때 10대였던 80년생의 삶을 IMF를 중심으로 두고 기술해 보려고 했던 이 책은 인터뷰이들의 면면만 보고도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였다. 나에게 서문은 저자의 긴 변명문이었다.
저자가 서문에서 인터뷰이를 선택한 주요 채널을 트위터로 삼았다고 하길래, ‘어, 신선한데? 그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물색하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구나. 80년대생답다!’라고 흥미롭게 생각했다. 하지만 저자가 선택한 7명은 모두 대학교육을 경험했고, 다수는 중산층 출신에다가, 절반은 명문대를 경험했다. ?!?!?! 이렇게 편향된 7명의 이야기를 모아서 어떻게 일반화할 만한 큰, 사회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자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겨뤄보려는 7개의 분신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자가 이미 이해해서, 해석이 쉬운 사람들만 추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왜 좀 더 이 사회의 끄트머리에서 미끄러져 살아온 동년배의 친구들의 목소리들을 채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서문 3에서 자신의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아보려는 충분히 시도를 하지 않고, 이걸 자신의 한계로 치부해 버린 작가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시대의 기록자가 된다는 것에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2011년 동일본 지진에 대해 다른 매체에서 쓴 ‘현장으로 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다룬 기사를 언급했다. 그것은 기사로서는 실패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해현장의 처절함을 진실되게 보여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저자가 자신의 결과물을 보는 잣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저자가 자신의 이 책은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라고, 이 젊은이들의 삶을 읽어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맵게 쓰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할 것이다.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많이 울컥 했고, 사실 조금 울었다. 7명의 이야기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근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들인데, 너무 생생해서 파워풀하다. 이 책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이들의 이야기들에 모두 삼켜졌다. 이 땅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삼성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든지, 우연히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 사상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되어 가장 왼쪽에 섰다가 지금은 중도보수의 당에서 일하는 광주 기반의 정치가이든지, 모두 돈의 룰에 맞춰 그들의 계급이 어느정도 결정되었다.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김마리씨, 김남희씨, 김괜저씨. 특히 첫 번째로 소개된 김마리씨의 이야기가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든 추동력이었다.
이야기들에서 IMF의 결정적 흔적은 희미하지만, 나의 후배들인 현재 30대의 삶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책은 현미경으로 한 명씩 들여다보려고 했던 책이지,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이야기까지 당겨오려는 욕심은 없었던 것 같다.
‘시도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그것이 한계였다고 윤색하고 어쨌든 기획은 잘 했으니, 이 미션은 그런대로 잘 끝낸 거 아닌가 하고 쉽게 자위하는 태도가 IMF 키즈, 80년대생의 특징은 아니겠죠.’라고 (저자에게) 냉정하게 묻고도 싶었지만, 일곱명의 이야기를 다 읽은 후에는 그저 그들의 불안*1)과 부끄러움*2)과 개드립*3)과 너무 쓰레기는 되지 말자*4)는 다짐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싶다. 의심하며 위로해서 미안하지만.
1) 서유진씨의 인터뷰 내용 중 – 전 그냥 불안한 게 너무 관습화됐어요. 저는 ‘불안이 불안을 조장하는 거다. 굳이 그런 데 휩쓸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웃음) 불안할 수 있게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2) 홍스시씨의 인터뷰 내용 중 – 최근에 든 생각은 뭐냐면, 정말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친구들에게 미안함보다는 안 치운 내 방에 대한 부끄러움이 커요. 그래서 미안함보다는 부끄러움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남편도 먼저 죽고 아들도 먼저 죽었는데 손녀까지 먼저 죽으면 되게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3) 역시 홍스시씨의 인터뷰 내용 중 – 근데 순간순간 나오는 개드립은 진심이에요. 히히히. 제 입에서 나오는 개드립은 말하자면 수면욕, 성욕, 식욕처럼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농담이 즐거워서 나오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그냥 말장난, 개소리 같은 걸 내뱉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떠는 최대한의 위선이에요.
4) 전혀 없진 않죠. 돈 주면 하겠죠. 근데 하는 데까진 제 스타일대로 해보려고요. 어쨌든 작품으로 승부하는 게 좋고, 제일 양심적인 것 같아요. 사기를 쳐도 좀 양심적으로, 말이 되는 정도로 하자, 너무 쓰레기 되지 말고.